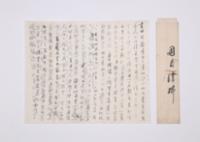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850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김노겸 간찰 / 金魯謙 簡札
- ㆍ발급자
-
김노겸(金魯謙, 1781~1853,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능규(沈能圭, 1790~1862,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3.3 × 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미상년(1845년 추정)에 김노겸(金魯謙, 1781~1853)이 상대가 부탁한 일에 대한 경과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 연월일 및 발급자 정보 모두 누락되었고, 일반적인 간찰의 투식이 생략되는 등 형태사항으로 봤을 때 별지로 추정되기도 하나, 서체나 행문 습관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드러나는 정황상 발급자가 ‘김노겸’인 번 간찰의 영본(零本)으로도 추정된다.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전면에 ‘圃月淸拂(圃月은 月圃의 오기)’이라고 기록하였고, 본문 가운데 상대의 호를 ‘신천옹(信天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통해 수신자는 월포(月圃) 심능규(沈能圭, 1790~1862)임을 알 수 있다. 전면과 배면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면의 경우, 처음 “言曰”로 시작하는데, 번 간찰의 끝부분이 “蔽一”이고 별다른 결사 투식 없이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이 두 문서를 이어 “한 마디로 말하자면[蔽一言曰]”이라는 성어가 됨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상대가 비록 정동(貞洞) 측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다고는 하나 정동은 형에 대해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정도로 여겨짐을 언급하였고, 상대가 부탁한 일은 모두 따르기 어려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등의 말로 서두를 떼었다. 그리고 도섬(道剡, 관찰사의 천거)이 온다거나 감초(監初, 감시 초시)에서 특별히 청탁하는 일을 언급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쉬울 듯하니 조만간 올라와 직접 청해봄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자신도 곁에서 돕겠지만 별 효과가 없을 듯하니 고민된다고 하는 등 상대가 부탁한 모종의 일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어서 자신의 경우 힘을 잘 썼기에 70세의 늙은 나이에 사과(司果)가 될 수 있었고, 아들도 42세 이후에 복시(覆試)에 들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는 모두 때가 되면 이루는 것이지 어찌 인력으로 되겠냐고 하면서, 상대는 호가 ‘신천옹(信天翁)’인데 아마도 물중(物中)의 신천이 아니겠냐고 하였다. 관동(關東)의 수령은 어찌 얻기 쉬운 일이겠냐며, 아직 실직이 없는 세력 없는 사과가 비록 지방관 한 자리를 맡는다 해도 지극히 잔박한 해에 호서의 현감 자리 하나만 해도 족하니, 관동‧해서(海西)‧양남(兩南)의 관찰사와 같은 자리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면의 경우 추록으로 추정되며, 어떤 일에 대해 상언(上言)하는 일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상언이 도계(道啓, 감사의 장계)보다 용이하므로 임금의 능행(陵幸) 때 다사(多士)들이 모여 상언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도승지나 동부승지의 긴경(緊徑)을 얻어 상달한다면 예조에서 거행 할 것이니 몸소 와서 상언 하고 좌상(左相)에게 애걸한다면 일이 이루어질 도리가 있을 것이라는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수신자는 당시 사과 벼슬에 있는 상대를 통해 관직자리를 청탁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신자 스스로 ‘70의 늙은 사과’, ‘실직을 받지 못한 세력 없는 사과’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그가 부사과(副司果)에 제수된 1844년(헌종10) 10월 이후, 홍산현감(鴻山縣監)에 제수된 1845년 9월 사이에 이 간찰이 발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만일 번 간찰의 영본이라면 1945년 2월 6일에 발급되었을 것이다. 그가 군직(軍職)인 부사과를 받게 된 경위는, 당시 현종의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의 가례(嘉禮)를 치르기 위해 권설아문으로 설치된 가례도감(嘉禮都監)의 감조관(監造官)을 맡게 되면서, ‘실직이 없는 자가[時無職名] 권설아문의 겸직(兼職)을 맡게 되는 경우 군직을 부여하여 직명을 띠게 하는[冠帶常仕]’ 규례에 따라 받게 된 것이다. 『승정원일기』를 참조하면 그는 가례도감 도제조의 건의에 따라 8월 26일에 부사용(副司勇)에 제수되었고, 이후 10월 25일에 부사과에 제수되었음이 확인된다. 상언은 소지류(所志類) 문서 가운데 하나로 백성이 정려(旌閭)‧산송(山訟)‧증직(贈職)‧입후(立后)‧설원(雪冤) 등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여 승정원을 통해 임금에게 상달할 때 사용했던 문서이다. 도계는 위와 같은 사안을 소속한 도의 관찰사를 통해 임금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이때 사용되었던 문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단지 문서만 상달했던 것이 아니라 중앙의 유력자들에게 미리 청탁했던 관행을 볼 수 있다. 발급자로 추정되는 김노겸은 자는 원익(元益), 호는 성암(性菴)·길고자(吉皐子), 본관은 경주(慶州), 부친은 사헌부감찰 김사주(金師柱), 아우는 김노석(金魯錫)이다. 1814년(순조14) 식년시에 진사로 입격하였고, 음관으로 혜릉참봉‧예빈시주부‧홍산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성암집』이 있다.
- · 『憲宗實錄』 『承政院日記』 심능규 저/신상목 역,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5 월포기』, 율곡연구원, 20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수집사료해제집 1편:강릉 창녕조씨 소장자료 목록)
참고자료
제목 없음
言曰兄雖厚望於貞洞貞洞則如兄舊要不患無人且所請者皆是難從之請不可成之事豈有可諧之理耶後便必以道剡或來或監初另托而道剡似易於監初從近上來一番面乞未知如何耶弟雖從旁萬端哀乞恐無顯效是悶是悶五十除講之說皆是妄度也幸勿信聽如何兒子長孫皆以二日瘧大痛極悶極悶在己則用力在人則奈何之敎容或無恠而兄實不知我者也弟若善爲用力則雖甚無似豈至於七十老司果而兒子亦豈待四十二歲而後始得湖名一覆試耶雖然一司果一覆試亦必時到而後成豈可以人力爲之耶兄自號信天翁而信不得及恐有愧於物中之信天翁仰呵仰呵東麾亦豈可容易得之耶尙未付職之無勢司果雖或得一麾至殘至薄之歲湖一縣監足矣安敢望關東海西兩南耶尤呵尤呵信筆胡草橫竪說去葫疎蘆折極矣諒恕休咎是企是企上言比道啓甚易行幸時以多士上言臣子上言別監後若得都承旨或同副承旨之緊逕以爲上達則自禮曹擧行此亦躬來上言哀乞於左相則或有適得之道而大臣初無特達賜旨稟處之例耳 行幸以綏陵貞陵行次則來月十一日耳
圃月淸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