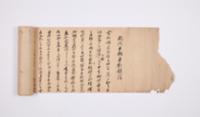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532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시문류-시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의 심능규의 금강록에 대한 비평, 교정문과 시문 / 批評文, 詩文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능규(沈能圭, 1790~1862)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4 × 740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부분 훼손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沈能圭의 화갑을 축하하는 시문을 모아놓은 詩軸.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목 없음
금강록을 이렇게 보내어 보여주시니 한 차례 펼쳐보고 이미 거작임을 알았습니다. 글 중에 비단에 수놓은 듯한 구절이 많고 구절 중에는 모래를 헤쳐 금을 가려내는2) 솜씨가 많았습니다. 읽으면 입에서 꽃이 피어나고3) 읽으면 입에서 꽃이 피어나고4)보면 눈이 공연히 놀라 찬란하고 황홀함이 사람의 이목을 가득하게 하니, 또한 하나의 설보손(薛保遜)의 금강저(金剛杵)입니다.5)
또 보았더니 별지로 부친 글에 바로 도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다듬잇돌이나 망치를 청하듯이 하였습니다. 남의 글을 받아 고치는 것은 본디 적임자가 있으니 이 어찌 나에게 있겠습니까. 나는 곧 귀로 듣기만 하고 마음이 아둔한 부류이니 이렇게 흐리멍덩한 들판의 쑥과 같은 눈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 시문의 가부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품평은 과연 서로 만난다면 혹시 말할 만한 소견이 없지는 않겠지만 참으로 이에 대해 갑자기 붓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근한 말을 끝내 저버리기 어려우니 일단 한두 가지 망령된 말을 먼저 「변편(弁編)」의 서문을 따라 이처럼 이야기하고 다음에 시편을 차례로 언급하여 어리석은 생각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오직 변통하여 꾸미는 생각만 있으니, 산천이 노여워하고 꾸짖으며 원망하지 않을지요. 도리어 어리석어서 안목 있는 사람에게 비웃음을 살지 걱정됩니다.
서문의 배열은 뜻이 참으로 좋은데 자구 사이에 군더더기 말이나 글자와 구절이 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언(焉)’ 자를 많이 썼는데 이는 옛 문체가 아닙니다. 혹시 시속 문투의 어법이 아닌지요? 그중에 ‘오산언(五山焉), 오명언(五名焉)’의 두 ‘언(焉)’ 자는 모두 긴요하지 않습니다. ‘옥석(玉石)’ 아래의 ‘고가이천오백여리(高可二千五百餘里)’는 비록 옛글에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태정녕진구(太丁寧塵臼)’ 아래의 ‘누년거하지망(累年擧下之忙)’은 윗 구절의 구법(句法)과 서로 흠이 되는듯합니다. 그 아래의 ‘즉(則)’ 자와 함께 빼도 무방합니다. ‘기장불유어산수이내이야(其將不遊於山水而乃已耶)’라고 한 것은 뜻이 모호한 데에 가까우니 ‘불(不)’ 자 아래에 ‘득(得)’ 자를 첨입하고, ‘이(已)’ 자 아래에 ‘지(之)’ 자를 첨입하고 ‘지유(之遊)’ 아래의 ‘즉(則)’ 자도 빼고, ‘강허(强許)’ 아래 ‘호(乎)’ 자는 ‘여(歟)’ 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오비(吾非)’의 ‘비’ 자는 ‘무(無)’ 자보다 못한 듯하고 ‘취근(取近)’ 아래의 ‘즉(則)’ 자는 모두 빼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탐승(探勝)’ 아래에 ‘이심숭고(而甚崧高)’ 4글자를 첨입하고 ‘유지(遊地)’ 아래 ‘불필첩상이매거야(不必疊床而枚擧也)’ 8자를 지워버리고 ‘불부론(不復論)’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 아래 ‘자화암이북 직저금강초연 기소위비로봉(自華岩以北直抵金剛超然豈所謂毗盧峯)’이라는 것은 정말 잘 썼으니 글을 짓는 법은 당연히 이래야 합니다. ‘만이천봉(萬二千峰)’의 ‘천’ 자도 긴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제일이(第一二)’ 자는 너무 군더더기 말입니다. ‘선관(仙官)’의 ‘관’ 자는 어찌하여 ‘자(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목은 ‘유금강시집서(遊金剛詩集序)’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은 비장의 생각을 뽑아내어 아름다운 말을 펼쳐 거의 물을 뒤집듯 이루는 것6)이니, 이는 갈고 닦는 수단이 많은 것을 더욱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가혹한 평가라면, 백옥에 작은 티는 간혹 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정암(釘岩)〉 시 첫 구절의 ‘구람승평시봉처 방지전후사지재(舊覽勝平時逢處方知前後思旨哉)’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다만 ‘평(平)’ 자를 ‘타(他)’ 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끝 연구의 ‘병유기(幷遊期)’ 3글자는 평범합니다.
〈유화사(留華寺)〉 시 함련(頷聯)의 ‘심상청경지산사 차제서명도해루(尋常聽磬知山寺次第書名到海樓)’는 산호의 가지7)를 꺾었습니다. 다만 ‘서명’ 2글자는 의미가 있는듯하지만 실제로는 풍취가 없으니 ‘간화(看花)’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첫 구절의 ‘기화(奇花)’는 서로 모순되는 듯하니 ‘진금(珍禽)’으로 대신해도 무방하겠습니까? 항련(項聯) ‘봉첨(峰瞻)’의 ‘첨’ 자는 모자란듯하니 ‘내(來)’자로 바꾸는 것 또한 어떻겠습니까?
다음 편의 첫 구절 안짝의 ‘피무(披霧)’와 바깥 짝의 ‘대우(帶雨)’는 서로 방해되는 의미가 있는듯하니 ‘피무’를 ‘휴장(携杖)’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소대우인경(蕭蕭帶雨人景)’과 함련의 ‘고명하소취 입경갱심진(顧名何所取入境更尋眞)’ 또한 사랑할 만합니다. 다만 끝 연구의 ‘풍(風)’을 보니 ‘권거지운(捲去之雲)’에 양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증지선(贈智仙)〉 시 첫 구절의 ‘연(延)’ 자는 그 아래 구절 ‘일지선(一智仙)’의 ‘일’ 자와 어긋나니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과 바깥 양짝의 의미가 주객이 뒤바뀌었습니다.
〈발화암(發華岩)〉 시 첫 구절 ‘산우비비만갱청 행인임발삭전정(山雨霏霏晩更晴行人臨發數前程)’은 실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청간정(淸澗亭)〉 시의 ‘분만리(噴萬里)’는 너무 지나칩니다.
다음 편 ‘소괴(所傀)’의 ‘괴’ 자는 ‘괴(怪)’ 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첫 편의 ‘흥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어찌하여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마석(自磨石)〉 시 마지막 연구(聯句)의 ‘황부기간이촌론(況復其間以寸論)’은 심히 무딥니다.
‘봉대수신축(烽臺誰新築)’ 아래의 ‘탄(歎)’ 자는 없애고 ‘시야(是也)’ 아래에 ‘여(歟)’ 자를 넣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백도(白島)〉 시는 홀로 선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8)
〈가학정(駕鶴亭)〉 시 첫 구의 ‘편월한담세욕원(片月寒潭勢欲圓)’은 정말로 타당합니다. 마지막 연구의 ‘풍광소양대인간(風光小陽大人看)’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태소정(太素亭)〉 시의 마지막 연구 ‘우합(尤合)’의 ‘우’ 자는 ‘단(端)’ 자로 고치고, 그 주석의 ‘아중곤우주식(衙中困于酒食)’은 ‘군아극취차포(郡衙劇醉且飽)’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등연정(登蓮亭)〉 시 한 편은 원만합니다.
〈능파선(凌波仙)〉 시 첫 구절은 방춘(芳春)을 탐낼 만하고 성서(盛暑)를 없앨 만합니다.
〈봉암(鳳巖)〉 시 마지막 연구는 과연 삼푼을 얻었습니다. 그 주석 ‘앙유(仰乳)’ 아래에 ‘양자(樣者)’ 2글자를 첨입하면 좋을듯합니다.
〈명파역(鳴波驛)〉 시는 한가하고 심원하며 넓고 트였습니다.
감호(鑑湖)〉의 주(註)에 ‘그 곳에 구선봉(九仙峰)이 있고 왕왕 독바위가 우뚝 서 있다.’는 좋습니다.
〈현종암(懸鍾岩)〉 시 마지막 연구의 ‘의구재(依舊在)’는 ‘장자재(長自在)’로 고치고 ‘증종(曾從)’은 ‘위종(謂從)’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랑호(永郎湖)〉 주석의 ‘차호(此湖)’ 아래에 ‘이시기총운(而是其塚云)’ 5글자를 첨입하면 좋을듯합니다.
〈곡입고성읍(谷入高城邑)〉 시 마지막 연구의 ‘문래지시(聞來知是)’는 ‘거인운시(居人云是)’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으며, 그 주석의 ‘과(果)’ 자도 ‘내(乃)’ 자로 고쳐도 무방합니다.
〈해금강(海金剛)〉 시 함련의 ‘군산수범동 거랑임풍용(群山隨帆動巨浪任風舂)’ 구절은 좋습니다. 마지막 연구의 ‘장년증거처(長年曾去處)’는 뜻한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편(全篇)에서 말한 바를 보니 ‘참치오육봉 암상지송송(參差五六峰岩上只悚松)’이라고만 한다면 군옥대(群玉臺)의 경치를 다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망악정(望嶽亭)〉 시의 ‘동민락(同民樂)’ 3글자는 도치되어 말뜻이 보통과는 다릅니다.
〈해산정(海山亭)〉의 주석에 ‘시판(詩板)’의 ‘판’ 자는 없애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시어(詩語)가 자못 허전하니 나는 달팽이 뿔에서는 천 개의 나라도 작고9) 소털에서는 만사가 한가롭다고 여깁니다.
〈대호정(帶湖亭)〉 시의 ‘분몌창(分袂悵)’의 ‘창’ 자는 도리어 ‘처(處)’ 자만 못 합니다.
〈사선정(四仙亭)〉 시 첫 구절의 ‘경면(鏡面)’은 ‘경포(鏡浦)’로 고치고, 마지막 연구의 ‘송교이박석양주(松橋移泊夕陽舟)’는 그림 같습니다. 그 주에 ‘그 형상이 서로 비슷한 것을 취하여 이름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체로 위아래의 시와 주석을 보건대 경호(鏡湖)를 인용하여 이야기한 곳이 많으니, 그대는 참으로 고인(高人)이 아니겠습니까.
〈백천교(百川橋)〉 시는 훌륭한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노춘정(盧春井)〉 주석의 ‘전(前)’ 자는 ‘고지(古之)’ 2글자로 고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유점사(楡岾寺)〉 시 첫 구절의 ‘창망해객좌무심(蒼茫海客坐無心)’은 온당치 않은듯합니다. 항련(項聯)의 ‘오탁천환연적적 용음루외백삼삼(烏啄泉還烟寂寂龍吟樓外栢森森)’은 한가롭게 즐길만합니다. 다만 ‘천’ 자는 본래 이름인 ‘정(井)’ 자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듯합니다. 그 주석 중에 ‘오당(吾當)’은 ‘오역당(吾亦當)’으로 고치고 ‘수진탕(水盡湯)’의 ‘탕’ 자는 ‘탕(盪)’ 자로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쇠로 만든 시루 안에 여러 말의 쌀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괜찮지만 서너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안 될 듯합니다.
〈등중내원(登中內院〉) 시 ‘청운시처상흉금(聽雲是處爽胸襟)’에 대해 나는 그 ‘상금(爽襟)’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선담(遊船潭)〉 시는 뜻이 절로 유유자적하여 시가 자연 담담합니다.
〈중내원귀로(中內院歸路)〉 시의 첫 구절 ‘파심만리류(波心萬里流)’는 자못 분수에 지나칩니다. 항련의 ‘단섭연애활 경공우석수(短屧緣崖滑輕笻遇石愁)’은 과연 그러합니다. 다만 ‘수’ 자는 언뜻 ‘활’ 자가 꼭 맞는 것보다 못합니다.
〈만경동(萬景洞)〉 시 첫 구절의 ‘완(宛)’ 자는 ‘현(顯)’ 자로 고치고, 마지막 연구의 ‘능(能)’ 자는 ‘응(應)’ 자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운동(曉雲洞)〉 시 마지막 연구의 ‘노석무언수가진 용음고택수공류(老石無言誰可儘龍吟古澤水空流)’는 할만한 말입니다.
〈은선대(隱仙臺)〉 시 마지막 연구의 ‘선거천년대상재 층층은폭백운간(仙去千年臺尙在 層層銀瀑白雲間)’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안하령(雁下嶺)〉 시 마지막 연구 ‘하유차득도중리 직상고봉불용여(何由借得到重履 直上高峰不用輿)’는 탄환 같습니다.10) 그 주석의 ‘교체(交遞)’ 아래에 ‘내(乃)’ 자를 첨입하고 ‘계(界)’ 자 위에 ‘분(分)’ 자를 첨입하면 좋겠습니다.
〈제백화담(題白華潭)〉 시 첫 구절의 ‘수우방원팔곡반(水遇方圓八曲盤)’은 뜻을 얻은 묘수입니다.
〈감로정(甘露井)〉 시 마지막 연구의 ‘제공차제존(諸公次第存)’은 ‘존’ 자가 튈 뿐 아니라 ‘풍랭(楓冷)’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하연(摩訶衍)〉 시 첫 구절 ‘오연기처다(午烟起處多)’는 말이 실상을 지나치는 듯합니다.
〈비로봉(毗盧峯)〉 시 첫 구절의 ‘우(又)’ 자는 타당하지 않고 ‘만지군봉파랑정(滿地群峯波浪靜)’은 말뜻에 방해되는 바가 없겠습니까. 마지막 연구의 ‘등림불각입창망(登臨不覺立蒼茫)’은 득의한 부분입니다. 그 주석에 ‘창명(滄溟)’ 아래의 ‘가이아어곤륜야(可以亞於崑崙也)’는 ‘의자거천일악 준극우천 자기비아어곤륜자여(意者去天一握峻極于天 玆豈非亞於崑崙者歟)’로 고치는 것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다음 편 첫 구절 ‘반소(半搔)’의 ‘반’ 자는 ‘반(反)’ 자로 바꾸는 것 또한 어떻겠습니까?
〈보덕굴(普德窟)〉 시의 ‘입창망(立蒼茫)’은 비로봉과 어의와 처지가 모두 법도가 있습니다. 그 주석의 ‘사층류(四層樓)’ 아래의 ‘유(有)’ 자는 ‘용(用)’ 자로 고쳐도 무방합니다.
〈만폭동(萬瀑洞)〉 주석의 ‘석면(石面)’ 아래 ‘유(有)’ 자는 ‘다(多)’ 자로 고치고, ‘승사(僧史)’ 아래 ‘상(相)’ 자는 없애도 무방합니다. ‘팔자야(八字也)’는 ‘팔대자(八大字)’로 고치고, ‘기상우유(其上又有)’는 ‘우기상유(又其上有’)로 고치고, ‘양봉래팔자(楊蓬萊八字)’ 아래에 ‘서(書)’ 자를 첨입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표제어 ‘금강총음(金剛總吟)’은 ‘총음금강’으로 고치고, 그 아래에 ‘각(刻)’ 자를 첨입해도 무방합니다. 그 시 중 항련의 ‘신생우한유난월 족섭풍운가편관(身生羽翰猶難越足躡風雲可遍觀)’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석 중 ‘단확(丹臒)’ 아래 ‘기삼층화옥(其三層畵屋)’ 5글자는 없애고 ‘굉걸(宏傑)’ 2글자로 고쳐도 무방합니다.
〈금강대(金剛臺)〉 시 첫 구절 ‘동호하승(同好何僧)’은 ‘호위불(胡爲不)’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항봉(獐項峯)〉 시 첫 구절 ‘춘초점간장유사자흔수미륭임오류(春稍漸看獐有些子痕須彌隆任鏖流)’ 아래의 14글자는 지워 버리고, ‘기동유자탑 우기동유손탑(其東有子塔 又其東有孫塔)’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위아래의 여러 주석에 ‘언(焉)’ 자를 쓴 곳이 많습니다. 일일이 곳에 따라 들어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심히 긴요하지 않으니 자연 군더더기 글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또한 써야 할 곳이 있어 일괄적으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향성(衆香城)〉 시의 마지막 연구는 음미할 만합니다.
〈헐성루(歇惺樓)〉 시의 마지막 연구도 아름답습니다. 주석 중 ‘석가봉(石伽峰)’의 ‘석’ 자는 바로 ‘석(釋)’ 자입니다. ‘가섭봉(伽葉峰)’ 아래에 ‘분대회합(紛對回合)’ 4글자를 첨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일대(天一臺)〉 시는 익숙한 솜씨입니다.
〈백화암(白華庵)〉 시 마지막 연구 ‘당년희탁월사지(當年喜托月沙知)’는 뜻이 좋습니다.
〈삼불암(三佛岩)〉 시 마지막 연구의 ‘완(宛)’ 자는 눈이 밝아지는 듯합니다.
〈영원동(靈源洞)〉 시 마지막 연구 또한 적합합니다.
〈숙장안사(宿長安寺)〉 시는 당일의 경치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함련(頷聯)의 ‘척강침음(陟降沈吟)’은 대구(對句)가 정확하지 않은듯합니다. ‘두장백(頭將白)’ 3글자는 실상을 말한 것이지만 흥겨워 두루 유람하며 명승지를 찾아다니는 말은 아닌듯합니다.
〈추지령(楸池嶺)〉 시 첫 구절 ‘호(胡)’ 자는 ‘기호(其胡)’입니다.
〈맹교(盲橋)〉 시 마지막 연구의 ‘오제감언여의(吾儕敢言與意)’는 구절과 지은 것이 모두 온당치 않아 차이가 있고 또한 다 보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체로 구절을 찾는 것에 어찌 반드시 마음을 먹고 하겠습니까.
〈총석정(叢石亭)〉 시는 자못 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함련에 ‘동우(棟宇)’와 ‘누대(樓臺)’를 대구로 삼은 것은 좌우의 두 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내외 구의 ‘장욕(將欲)’ 2글자 또한 하나의 뜻이니 형세에 어긋나는 점이 또 있는듯합니다. ‘기(起)’로 ‘욕’을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항련(項聯) ‘기과사선봉(其果四仙峰)’이라고 한 것은 사사로운 생각입니까? ‘희효취상릉개육 옹중전신입매쌍(羲爻取象稜皆六翁仲傳神立每雙)’의 구절11)이 없어 한스럽습니다.
〈와총석(臥叢石)〉 시 항련 ‘잠장대거부삼도 신욕희래기다정(蹔將帶去浮三島 蜃欲噫來起多亭)’는 좋은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구의 ‘우간(尤看)’ 2글자는 시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바람을 맞아 공경히 절하고 술이 조금 깨는 뜻이 있습니다.
표제어에 ‘중도감기릉산해 이독부득경신술(中途敢氣陵山海 而獨不得輕身術)’은 ‘兼旬遊賞氣陵山海 而獨無輕身術(겸순유상기릉산해 이독무경신술)’로 고치는 것이 마땅할듯합니다.
〈신계사(神溪寺)〉 시 항련은 조금 낫습니다.
〈금강문(金剛門)〉 시 마지막 연구의 ‘개래(開來)’는 ‘치래(侈來)’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봉폭(飛鳳瀑)〉 주석의 ‘사류(瀉流)’ 아래의 ‘이래(而來)’ 2글자는 없애고, ‘차즉(此則)’의 ‘즉’ 자는 ‘내(乃)’ 자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목은 ‘비봉과 무봉의 두 폭포를 지나 구룡연에 이르다[過飛鳳舞鳳兩瀑 到九龍淵]’라고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구룡연〉 시도 매우 곱고 아름답습니다. 함련의 ‘교폭(驕瀑)’은 ‘현수(懸水)’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석 중 ‘팔자이(八字耳)’의 ‘이’ 자는 곧 군더더기 글자입니다. 원래 폭포에 대한 시는 예로부터 좋은 작품이 없습니다. 오직 최고운(崔孤雲)의 ‘혹공시비성도이 고교류수진농산(或恐是非聲到耳 故敎流水盡聾山)’12) 이후로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만물초(萬物草)〉 시는 과연 직접 본 것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입니까? 그 주석 중 ‘귀완(鬼剜)’ 아래 ‘지의(之意)’ 2글자는 빼고 ‘도지(倒地)’ 아래 12글자는 삭제하고 ‘각물난력석로심험(脚物難力石路甚險)’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삼우(三隅)’의 ‘우’ 자 또한 빼도 무방합니다.
〈과온정(過溫井)〉 주석에 ‘여어시처 수과려이환(余於是處遂跨驢而還)’은 ‘여도차 수기려이행(余到此遂騎驢而行)’으로 고치고, ‘사아호(私我乎)’는 ‘사호아여(私乎我歟)’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막지(莫知)’ 아래 ‘막지(莫之)’ 2글자는 군더더기 말인듯합니다.
〈우경구(遇景九)〉 시는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말도 모호합니다.
〈사고성쉬(謝高城倅)〉 시 첫 구절 ‘삼작(三爵)’의 ‘작’ 자는 사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신다일면연(矧多一面筵)’은 구어와 형상 모두 손색이 있습니다. 그 주석 중 ‘사(私)’ 자 아래에 ‘차(次)’ 자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사간성쉬(謝杆城倅)〉 시 첫 구절의 ‘지양인(只兩人)’은 ‘아양인(我兩人)’으로 고치고, 마지막 연구의 ‘권취(勸醉)’는 ‘상권(相勸)’으로 고치는 것이 모두 어떻겠습니까?
〈몽유삼일포(夢遊三日浦)〉 시의 ‘양고(良苦)’ 2글자는 조화아13)의 괴롭힘을 면할 수 없어서 그러합니까? 단지 아이의 병 때문이 아니라 또한 흥에 겨워 유람을 좋아하는 뜻이 아니니 도리어 안타깝습니다. ‘대주권(對酒勸)’ 3글자는 껄끄럽고 그 아래에 주석 중 ‘제이삼사삼(第二三四三)’ 같은 글자는 ‘비료(費了)’ 2글자와 아울러 없애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적석(積石)’은 ‘삭옥(削玉)’으로 고치는 것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사람들에게 들으니 금강은 예로부터 시를 짓기 어려우니 진정 세속을 천 길이나 뛰어넘고 격식을 벗어나 초탈하지 않는다면 한마디 말로 진경(眞境)을 드러낼 수 없기에 비슷하게라도 꾸며내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또한 어렵습니다. 저 눈 위를 달리는 자가 감히 자취를 없애려고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보내온 작품을 보았더니 마음에 알맞게 절로 입에서 나오고 소리를 따라 굴절하니 기색은 넓고 기미는 윤택하며 가을 물의 맑은 정신을 겸하였습니다. 때로 땅에 던지면 쇠로 만든 악기 소리가 날 것이니14) 시호(詩豪)라고 일러도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읊을 만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러 옅은 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는듯한15)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세속의 틀에서 나온 것을 끝내 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피차의 간격을 깎아버리고 분잡하고 화려함을 제거하고 작자의 한계를 다 깨뜨린다면 저절로 평이하고 탁 트인 경지에 나아가 문단의 우익이 되어 천하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사룡에 대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시문은 그 기량에 예리하거나 무딘 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어찌 굳이 심동양(沈東陽)의 탄환을 쏘아 손에서 떠난 것16)이라거나 탕혜휴(湯惠休)의 떠오른 햇살에 비친 부용17)으로 저것은 낫고 이것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唐)의 시문을 보고 어찌 한(漢) 때와 같지 않은가 하고 책망하며 송(宋)의 시문을 보고 어찌 당(唐) 때와 같지 않으냐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는 모두 한 쪽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당나라가 쇠퇴할 때 어찌 속된 악보가 없었을 것이며 송나라가 융성할 때 어찌 단아한 곡조가 없었겠습니까. 이는 바로 구금(鉤金)이나 여신(輿薪)18) 같은 부류입니다. 산이나 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산에는 오악(五岳)19)이 있으나 형질이 같지 않고 강에는 구하(九河)20)가 있으나 그 근원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험준하게 높이 솟은 것은 마찬가지이고 서로 부딪치며 물결이 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모두 산이 되고 강이 되는 데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산이면서 구릉 정도에 그치거나 물이면서 도랑 정도에 그치는 것은 그 아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천만 가지로 다른 모습을 하나의 틀에 묶는다면 자연의 이치에 병통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시란 요컨대 내용이 좋아야 바야흐로 아름답게 됩니다. 외경(外境)으로 인하여 정서가 생겨나고, 정서로 인하여 알맞은 말이 나오고, 그 말로 인하여 형식이 생겨나니, 운(韻)이나 격(格)은 이 네 가지 외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저 성색(聲色)으로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무성지성(無聲之聲)과 무색지색(無色之色)을 얻어 맑고 밝으며 투명하고 담박하여 외부의 정경과 정신과 부합하고 정신과 붓이 서로 응해 표현되어야만 야호외도(野狐外道)21)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가히 지내면서 지은 작품이 졸지에 응해서 지은 것보다 낫고 초야(草野)에서 지은 시가 관각(館閣)에서 나온 것보다 우수하였으니, 대개 의도적으로 짓는 것이 자연스럽게 짓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그 묘한 부분은 애오라지 코에 흰 흙이 없고 눈에 꺼풀이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코에 흰 흙이 없으니 자귀를 어디에 쓸 것이며 눈에 꺼풀이 없으니 대 칼을 어디에 쓰겠는다. 온통 천연으로 이루어져 다듬을 필요가 없는 천구(天球)라 해야 하겠다.”라는 것22)이 이것입니다. 맑음[淸]은 바로 시의 본령이니 맑으면 고상하고 고상하면 신묘합니다. 기이하다거나 굳건하다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입니다. 눈을 돌려 보면 옛날 일사(逸士)나 시승(詩僧)이 산수를 찾고 떠돌다가 그늘에서 쉬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만족한 것을 위해서였지 어떤 산이고 어떤 물이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의 이른바 맑은 못이나 푸른 절벽이 오석(烏石)이나 황류(黃流)23)가 아니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광려(匡廬)의 명승으로도 동파(東坡)의 글을 얻고 비로소 이름이 드러났습니다.24) 산악의 모습에 전후로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접때 금강을 유람을 하고 그 웅장하고 기이함에 적합한 것을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걸음을 떼는 데에는 굳세지만 입을 놀리는 데에는 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만 장(丈)의 깎아지른 봉우리를 반걸음 한 주먹 크기로 여겨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후일에 와서 보는 사람 또한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주자(朱子)에게 품평하게 하더라도 월수(越水)나 민산(閩山)25)과 같은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악기와 질그릇의 구별을 스스로 진작하되, 능금과 배, 귤과 유자에서 단지 각기 맛이 있는 것을 취하여도 되니, 저것을 가지고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자면 대개 유추할 것이 있습니다. 뜨락의 나무가 흔들려도 삽시간에 있다가 없는 것은 바람이고, 하늘에 덮여도 잠깐 사이에 개었다 끼었다 하는 것은 구름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다가 있고 구름이 더러 끼었다 갰다 하는 것은 일어날 곳에서 일어나고 멈출 곳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바람과 구름의 본색이니 본디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에 붓을 빼 들고 ■……■ 사룡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말은 단지 대략만 말하였는데 모두 횡설수설하여 하나도 이치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가 살펴보고 반드시 노망나고 광패한 말을 비웃을 것인데 어우(於于) 노인26)이 입을 열어 한바탕 웃어도 좋습니다.】
금강록 마지막 운을 써서 화답하여 바칩니다만, 심히 고루하니 귀먹고 눈먼 자의 가릴 수 없는 본색입니다.
금강산을 다시 보러 가게 된다면
빛나고 기이한 글 백 편 지으리
승경 고르며 완전히 피곤함 잊고
기승 찾으니 매번 자세하게 보네
술 마시길 위자애같이 하며
시 짓기를 미원장처럼 한다네27)
알겠구나 산은 소재로 충분하니
곧 상자와 주머니에 시 넘쳐나네
金剛如復見
光怪百篇成
選勝渾忘倦
探奇每好詳
酒從韋子愛
詩得米元章
已識山資足
況伊溢笈囊
다시 점인(店人) 운을 따서 끝에 붙입니다.
이름난 산 천 만 봉우리 두루 다 둘러보고
바닷가의 좋은 누각 고루고루 유람하였네
나도 또한 그 당시에 먼저 지났던 객으로서
경치 구경 탐닉하여 석양빛 깨닫지 못했지
看盡名山千萬疊
周遊海上好樓中
吾亦當年前度客
耽觀不覺夕陽東
재주 있는 저 젊은이 심사룡이
늙은 시인 찾아 이곳에 왔다네
가을 깊어 강개한 마음 많더니
하늘 개어 정신 다시 새롭구나
少年沈才子
枉叫老詩人
秋高多慷慨
天霽更精神
보내온 시 어찌 저리 훌륭한가
금강산과 웅장함을 다툴 만하네
그대 비록 지금 내게 묻고 있으나
어찌 손바닥 안에서 찾지 않으랴
詩來何彼壯
可與山爭雄
君今雖問我
那得掌中中
효효와(嘐嘐窩) 80세 노인27)이 한잔 술의 힘을 빌려 남쪽 창 월계수 꽃 아래에서 쓴다.
1) 심사룡(沈士龍) : 심능규(沈能圭 1790~1862)를 가리킨다. 자는 사룡, 호는 월포(月圃)월포(月圃)·신천당(信天堂)·천청당(天聽堂)이며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강릉에 살면서 『인경부주(仁經附註)』를 편찬한 인물이다. 심능규는 70세에 1859년 증광시(增廣試) 진사에 급제하였다.
2) 모래를 ~ 가려내는 : 많은 사물 가운데서 정화(精華)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양(梁)나라 종영(鍾嶸)의 『시품(詩品)』에, “육기의 글은 마치 모래를 헤치고 금을 가려내기와 같아서 이따금 보배로운 작품을 볼 수가 있다.[陸文如披沙簡金 往往見寶]”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3) 입에서 꽃이 피어나고 : 담론(談論)하는 태도가 점잖거나 시가(詩歌)를 우아(優雅)하게 읊조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때 장우(張祐)가 시를 읊는 일에 열중하여 남이 불러도 듣지 못하였는데, 아내와 하인들이 이를 불평하자 그가 “내 입에서 바야흐로 꽃이 피고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어찌 들릴 리 있겠느냐.”라고 답한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운선잡기(雲仙雜記)』에 보인다.
4) 입에서 꽃이 피어나고 : 담론(談論)하는 태도가 점잖거나 시가(詩歌)를 우아(優雅)하게 읊조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때 장우(張祐)가 시를 읊는 일에 열중하여 남이 불러도 듣지 못하였는데, 아내와 하인들이 이를 불평하자 그가 “내 입에서 바야흐로 꽃이 피고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어찌 들릴 리 있겠느냐.”라고 답한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운선잡기(雲仙雜記)』에 보인다.
5) 설보손(薛保遜)의 금강저(金剛杵)입니다 : 설보손은 당나라 하동(河東) 사람으로 진사시에 급제하여 급사중, 사농경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인물 품평을 좋아하여 선비를 표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가 하후자(夏侯孜)를 ‘부박(浮薄)’하다고 품평하자, 하후자가 그를 예주사마로 좌천시켰다. 금강저는 범어로 벌절라(伐折羅)로서 본디 인도의 병기(兵器)를 삼았는데 밀종(密宗)이 빌려서 견리(堅利)의 지(智)를 표(標)하여 번뇌를 끊고 악마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금강저는 굳건한 마음을 갖추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 글에서는 훌륭한 작품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
6) 물을……것 : 한유(韓愈)의 〈기최이십육입지(寄崔二十六立之)〉 시에 “문장은 물을 뒤집듯 쉽게 이루어, 애당초 뜻을 기울이지 않는도다.[文如翻水成 初不用意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7) 산호의 가지 : 글씨의 기상이 힘차고 생동감 있다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석고가(石鼓歌)〉(『한창려집(韓昌黎集)』 권5)에 “난새 봉새가 날고 뭇 신선이 내려온 듯하고, 산호와 벽옥나무 가지가 서로 엇걸린듯하다.[鸞翔鳳翥衆仙下 珊瑚碧樹交枝柯]”라고 하였다.
8) 홀로……피었습니다. : 외따로 선 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글이 더욱 드러나 보인다는 의미이다. 두보(杜甫)의 〈수(愁)〉라는 시에 “반와(盤渦)에 목욕하는 해오라기 무슨 마음인가, 홀로 선나무에 꽃이 피니 절로 환하구나.[盤渦鷺浴底心性 獨樹花發自分明]”라고 하였다.
9) 달팽이……작고 :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는 세상사를 비유한다.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엔 촉씨(觸氏)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 위엔 만씨(蠻氏)라는 나라가 있어, 땅을 가지고 서로 다투어 수만 인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장자(莊子)』「즉양(則陽)」편에서 인용한 말이다.
10) 탄환 같습니다 : 시가 훌륭해 원윤정미(圓潤精美)하고 민첩유창(敏捷流暢)한 것을 비유한 말이다. 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시인 사조(謝眺)는 “좋은 시는 원숙한 아름다움과 유창함이 탄환을 쏜 것과 같다.[好詩 圓美流轉 如彈丸]”라고 말한 것이 『남제서(南齊書)』 권47 「사조열전(謝眺列傳)」에 보인다. 이후 소동파가 〈차운답왕공시(次韻答王鞏詩)〉에서 “새로운 시는 탄환을 쏜 듯하여, 손을 떠나 잠시도 머물지 않았네.[新詩如彈丸 脫手不暫停]”라는 표현을 써서 관용어가 되었다.
11) 희효취상릉개육 옹중전신입매쌍(羲爻取象稜皆六翁仲傳神立每雙)의 구절 : 남유용(南有容)의 시 〈총석(叢石)〉(『뇌연집(雷淵集)』)에 나오는 구절이다.
12) 최고운(崔孤雲)의 혹공시비성도이 고교류수진농산(或恐是非聲到耳 故敎流水盡籠山) : 최치원(崔致遠)의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이라는 시의 구절이다. 『고운집(孤雲集)』에는 ‘혹(或)’이 ‘상(常)’으로, ‘농(聾)’이 ‘농(籠)’으로 되어있다.
13) 조화아(造化兒) :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신(神)을 농담조로 일컫는 말이다.
14) 땅에……것이니 : 훌륭한 문장을 의미한다. 진(晉)나라의 손작(孫綽)이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짓고 나서 벗 범영기(范榮期)에게 “그대가 시험 삼아 이 부(賦)를 땅에 던지면 금석 소리가 날 것일세.”라고 한 데서 나온 표현이다.
15) 옅은……있는듯한 : 원문의 ‘점철(點綴)’은 구름이 하늘에 끼여 있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태부(太傅)인 사마도자(司馬道子)가 밤하늘의 맑은 달을 보고 찬탄을 하자, 사중(謝重)이 옆에 앉아 있다가 “옅은 구름이 끼여 있는 것만 못하다.[不如微雲點綴]”라고 하니, 태부가 “경의 마음가짐이 깨끗하지 못하다. 어째서 다시 맑은 하늘을 억지로 오염시키려 하는가.”라고 조롱했던 고사가 『세설신어(世說新語)』 「언어(言語)」편에 전한다.
16) 심동양……것: 심동양은 양(梁)나라 때 뛰어난 문장가로 일찍이 동양 태수(東陽太守)를 지낸 심약(沈約)을 가리키는데 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시인 사조(謝眺)의 시에 대해 심약은 항상 “200년 이래 이러한 시가 없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남북조 시대 진(晉)나라의 시인 사조(謝眺)는 “좋은 시는 원숙한 아름다움과 유창함이 탄환을 쏜 것과 같다.[好詩 圓美流轉 如彈丸]”라고 말한 것이 『남제서(南齊書)』 권47 「사조열전(謝眺列傳)」에 보인다. 이후 소동파가 〈차운답왕공시(次韻答王鞏詩)〉에서 “새로운 시는 탄환을 쏜 듯하여, 손을 떠나 잠시도 머물지 않았네.[新詩如彈丸 脫手不暫停]”라는 표현을 써서 관용어가 되었다.
17) 탕혜휴(湯惠休)의……부용 : 시편(詩篇)이 청신(淸新)한 것을 비유한다. 육조 시대 시승(詩僧)인 탕혜휴(湯惠休)가 사령운(謝靈運)의 시를 보고 막 떠오른 햇살에 비친 부용(芙蓉) 같다고 하였다.
18) 구금(鉤金)이나 여신(輿薪) : 일반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들어 우기는 것이나,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를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맹자』 「고자 하(告子下)」에 “쇠가 깃털보다 무겁다는 것은 어찌 한 갈고리의 쇠와 한 수레의 깃털을 말함이겠는가.[金重於羽者 豈謂一鉤金與一輿羽之謂哉]”라고 하였고,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시력이 추호의 끝은 살필 수 있으나 수레에 실은 나뭇단은 볼 수 없다.[明足以察秋毫之末 而不見輿薪]”라고 하였다.
19) 오악(五岳) : 중국의 5대 명산인 동악 태산(泰山), 서악 화산(華山), 남악 형산(衡山), 북악 항산(恒山), 중악 숭산(崇山)을 말한다.
20) 구하(九河) : 황하 하류의 수많은 지류를 가리킨다. 중국 고대 황하(黃河)의 아홉 지류(支流)를 말한다. 우(禹) 임금이 이 아홉 물줄기의 길을 내어 범람을 막았다고 한다.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이르기를, “구하(九河)가 물길로 간다.[九河旣道]”라고 하였다.
21) 야호외도(野狐外道) : 시문(詩文)의 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수준 낮은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선가(禪家)에서 외도선(外道禪)을 야호선(野狐禪)이라 한다. 옛적 어떤 사람이 선학을 말하다가 한마디를 잘못하여 5백 번 들여우[野狐]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전등록(傳燈錄)』에 보인다.
22) 대개……것 : 송나라 문인 당경(唐庚)이 『당자서어록(唐子西語錄)』에서 사영운(謝靈運)과 사사도(謝脁)의 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다. 『장자(莊子)』 「서무귀(徐無鬼)」에 보면, 영인(郢人)이 코 끝에 흰 흙을 묻히자 장석(匠石)이 바람 소리가 나게 자귀를 휘둘러 코는 다치지 않고 흰 흙만 떨어뜨렸다는 ‘운근성풍(運斤成風)’의 고사가 보인다. 그리고 『열반경(涅槃經)』에 보이는 소경이 의사를 찾아가자 의사가 즉시 칼로 눈꺼풀을 떼어내어 광명을 찾게 해 주었다는 ‘금비괄목(金鎞括目)’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23) 오석(烏石)이나 황류(黃流) : 진기한 것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오석은 비석이나 장식물 등을 만드는 돌이고, 황류는 노란빛의 울창주(鬱鬯酒)인데, 좋은 술을 뜻한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旱麓)〉에 “아름다운 저 옥으로 된 술잔에 황류가 담겨 있도다.[瑟彼玉瓚 黃流在中]”라고 하였다.
24) 광려(匡廬)의……드러났습니다 : 광려는 여산(廬山)의 별칭이다. 소식(蘇軾)의 〈제서림벽(題西林壁)〉(『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권23) 시에 의하면 “가로로 보면 산마루요 곁에서 보면 봉우리라, 원근에 따라 높고 낮음이 각각 다르구려.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다만 이 몸이 이 산 가운데 있기 때문일세.[橫看成嶺側成峯 遠近高低各不同 不識廬山眞面目 只緣身在此山中]”라고 하였다. 소식이 이 글을 쓰자 여산이 세상에 알려져 유명해졌다는 말이다.
25) 월수(越水)나 민산(閩山) :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북부와 절강성(浙江省) 남부 일대로 자양서원(紫陽書院)을 위시하여 주희(朱熹)의 성리학의 요람이 된 곳이다.
26) 어우(於于) 노인 :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을 가리킨다. 『어우집 후집(於于集後集)』 「시장(諡狀)」에 보면, 그는 광해군 말엽 금강산에 5, 6년 동안 은거하였다.
27) 술 마시길……한다네 : 심능규가 금강산을 유람하며 좋은 경치를 만나면 술 마시고 시를 짓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위자애(韋子愛)는 술을 좋아하던 인물로 보이나 자세하지 않다. 미원장(米元章)은 송의 문신이자 서화가인 미불(米芾, 1051~1107)을 말한다. 그는 규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기행(奇行)이 심했으나, 문(文)ㆍ서(書)ㆍ화(畵)에 모두 조예가 깊었고, 특히 글씨에 뛰어났다. 이름난 서화(書畵)를 많이 모았는데, 그것을 배에다 싣고 강으로 가니 밤에 광채가 뻗치었는데, 사람들이 미가홍월선(米家虹月船)이라 일컬었다. 『송사(宋史)』 권 444 「미불열전(米芾列傳)」에 보인다.
27) 효효와(嘐嘐窩) 80세 노인 : 이 글의 저자이나 미상이다. 심능규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지은 시를 모은 『금강록』에 대한 교감과 비평을 부탁한 것으로 미루어 뛰어난 학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금강록』의 교감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매우 가치 있는 글이다.